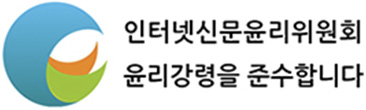역사 속 중앙 무대 뒤흔든 거물급 인물 드물어
학문적 경쟁력 한계 ‘큰 인물의 고향’ 사각지대
권력자 보단 ‘시대의 소명’ 스러져간 이들 많아
정몽주·조광조·류희 용인 품격 상징적 주인공
‘스쳐 가는 정거장’ 아닌 ‘인재의 산실’ 거듭나
용인신문 | 2025년 현재, 인구 110만 명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특례시로 우뚝 선 용인. 첨단 산업과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상징되는 이 역동적인 도시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품고 있을까. 용인신문은 ‘110만 용인특례시, 그 뿌리를 찾아서’ 연재를 통해 이 도시의 인문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역사 속 용인의 인물론을 통해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1 왕과 공신이 반한 땅, 용인
2 교육 도시 용인… 과거 합격율 최다(?)
3 풍수지리와 ‘명당’ 용인
4 용인 사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용인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본지 기획 특집의 마지막 회를 맞아, ‘용인사람(龍仁사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왔다.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 ‘세계 반도체 수도’를 꿈꾸는 용인특례시.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선뜻 답하지 못한다. 왜 용인의 얼굴은 이토록 희미한가.
해답의 실마리는 아파트 숲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땅의 역사, 그 깊은 곳에 새겨진 독특한 ‘체질’에서 찾을 수 있다. 용인은 태생적으로 ‘경쟁의 최전선’이 아닌 ‘보장된 이들의 후방’, 즉 ‘여유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숙명이야말로 오늘날 용인이 ‘인재의 산실’과 ‘스쳐 가는 정거장’ 사이에서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 너그러운 품을 지닌 고장… 권력 투쟁 무대서 벗어나
용인의 옛 이름 '멸오(滅烏)'는 크다는 의미의 고어 '말아', '마라'를 한자로 차음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자 표기만을 보자면 ‘까마귀를 멸한다’는 뜻이다. 삼국시대에 까마귀가 종종 적(敵)을 상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름 자체에 ‘적을 물리친다’는 군사적 기개가 서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2025년 현재 용인에는 지상작전사령부(전 육군 3군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용인은 역사 기록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무대이기보다, 언제나 느긋하고 너그러운 품을 지닌 고장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용인이 왕족과 공신의 식읍지(食邑地)였다는 데 있다. 조선은 개국공신과 왕족 후손에게 땅을 내려주었고, 그곳에서 거둔 조세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되었다. 후손들은 이미 신분이 보장된 사족(士族)으로서 지방의 기득권을 굳건히 다졌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음서(蔭敍) 제도였다. 공신이나 2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목숨을 건 파벌 싸움과 밤샘 공부라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음서는 조상의 그늘 아래 안온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온실’이었다. 이 온실 속에서 경쟁의 칼날은 무뎌졌고, 야망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기질이 대를 이어 뿌리내렸다고 보여진다.
용인을 본관으로 하는 유일한 성씨는 고려 삼한벽상공신 이길권을 시조로 하는 ‘용인 이씨’다. 조선 시대 좌의정 이세백을 비롯해 다수의 문과 급제자와 고위 관료를 배출한 명문가다. 그 밖에도 한양 조씨, 경주 김씨, 양천 허씨, 연안 이씨, 연일 정씨, 해주 오씨, 의령 남씨 등 여러 토착 성씨가 대대로 터를 잡아왔다.
그러나 용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중앙 무대를 뒤흔든 거물급 인물은 드물다. 이는 용인이 주변의 번성한 지역에 비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경쟁력과 기록의 힘이 부족했고, 그 결과 ‘큰 인물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얻지 못했음을 시사하는지도 모른다.
경쟁보다 안정을 추구했던 용인 땅의 성격은 인물들의 면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용인의 역사 인물들은 권력 투쟁의 승리자이기보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거나 신념을 위해 스러져간 이들이 주를 이룬다.
용인의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포은 정몽주(鄭夢周)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그의 묘가 아무 연고 없는 용인에 자리하면서, ‘충절’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용인을 대표하는 정신이 되었다. 조광조(趙光祖)의 개혁 정신이 깃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 조선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남구만(南九萬)이나 실학자이자 음운자인 류희(柳喜) 같은 인물처럼 용인은 치열한 현실 정치의 무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과 가치가 머무는 ‘성소(聖所)’의 역할을 해왔다.
■ 포용의 도시 발전 원동력… 혁신의 중심지 도약
용인시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 팽창기를 맞았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기능하며 수십만 이주민이 유입됐지만, 용인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강력한 구심점이나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안정을 추구하던 과거의 DNA는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고 지역 리더십을 키우는 데 취약했기 때문이다.
‘토박이 정치인’의 실종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지역 기반 정치인 대신, 중앙당의 전략에 따라 인물이 낙점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시민들 역시 용인을 영원한 삶의 터전보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결국 조선 시대 ‘음서의 그늘’이 낳은 안주하는 여유는, 현대에 이르러 ‘주인 없는 도시’라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바로 이 ‘정거장’에 새로운 DNA가 수혈되며 도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과거 용인에 없었던 ‘경쟁과 혁신, 그리고 세계를 향한 야망’이 새로운 주체들을 통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선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이끄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이라는 도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기술 패권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혁신이 이제 용인의 심장을 뛰게 할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용인외대부고와 수많은 대학은 ‘지적 경쟁’의 중심지로서 용인의 위상을 바꾸고 있다. 과거 음서의 후예들이 안주했다면, 이제는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는 ‘교육의 요람’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용인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안주하는 여유’라는 과거의 숙명과 ‘혁신적 경쟁’이라는 미래의 과제가 공존한다. 이제 용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DNA를 융합할 리더십이다. 정몽주의 충절과 같은 정신적 품격을 지키는 동시에, 대기업들의 첨단 기술력, 용인과 인연을 맺은 박세리, 우상혁 선수 등이 보여준 도전 정신을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용인은 마침내 ‘스쳐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고유의 품격을 지닌 ‘인재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다.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