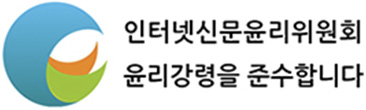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용인신문] “여기 온천이 어디 있어요?”
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정류장의 매표원 아저씨께 대뜸 물었다.
“온천이요?” “처음 듣는데!”
그러더니 건너편 누군가에게 묻고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는데요” 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천 가는 길 안내표시판 하나 없고 여기저기 백암 순대국 식당과 한적하게 자리 잡은 조그만 목욕탕 입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백암은 맞는데 … 왜 안 보이지!”
중얼거리며 순대국이나 먹으면서 물어보자며 남편하고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이야기다. 남편 직장 따라 용인으로 이사와 보니 고만고만한 집들을 뒤로하고 황량한 들판이 넓게 펼쳐진 물설고 낯 설은 이국땅이었다. 그래도 신혼 때인지라 그냥 이사 가면서도 생각나는 건 “살아 진천, 죽어 용인”이라던 아버님 말씀과 어디선가 들은 “백암온천이 유명하다” 는 말이 기억에 생생했다. 그래서 짐을 풀어놓은 후 어느 휴일 우리는 온천에나 가자며 가방에 이것저것 담아 먼지 풀풀 날리며 달리는 버스를 타고 백암으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버스는 여기저기 멈추며 사람들을 내리고 태우며 눈 동그랗게 뜬 여행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조금만 살다 이사 가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기에는 충분했다.
참으로 변화는 무상하다. 이렇게 오래 살 거였으면 누울 자리 알아보고 땅이라도 사두는 건데…. 황량한 들판에 우뚝 세워진 수많은 아파트, 먼지 날리던 길들에는 신호등이 반짝거리고, 짐 보따리 둘러메고 버스 길에 올라선 기억은 아득한 사진으로 남아 이런 때도 있었나 싶다. 유명세를 탄 백암순대는 전국 매장에서 맛볼 수 있고, 여기저기 서울 어디에도 찾을 수 있는 백암 순대국 식당에서는 고소한 순대국이 말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부모님들도 멀리 고향을 떠나 여식이 있는 용인에 묻히셨다. 온천은 없었으나 정드니 마음이 푸근해지고 오래 살다 보니 누울 자리도 여기 아닌가 싶다. 백암온천은 저 멀리 남쪽 지방에서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지만, 명물 순대는 용인 백암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