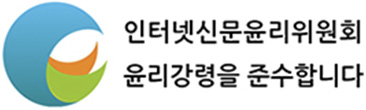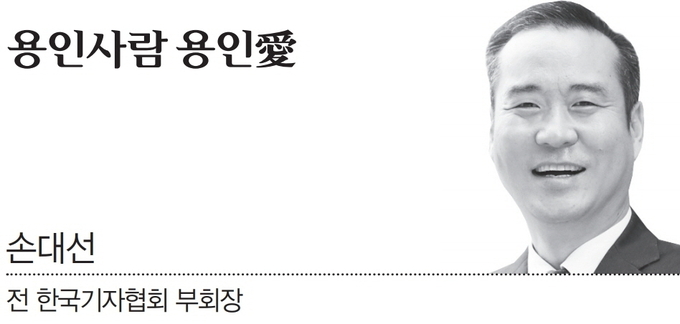
[용인신문] 신갈오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노부부가 있다. 가정집이나 상가건물에서 내놓은 종이박스가 그들의 주된 목표다. 80세가 훌쩍 넘은듯한 노부부는 비나 눈이 올 때만 빼고 매일 손수레를 끈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할머니가 뒤에서 민다.
쌓인 짐들이 많아 아슬아슬 할 때가 많다. 역주행이 잦다. 찻길을 가로지르다 몇번이나 자동차와 부딪힐 뻔했다. 차주인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경사길을 올라가다가 힘이 부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 사람이 도움없이 되는 일이 없어보인다.
거처인 연립주택 주차장 구석에 작은 야적상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가 급증했다. 신갈오거리 일대 사는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택배를 받고 내용물을 뺀 뒤 종이박스를 밖에 쉴새없이 버린다. 그래서 노인들은 쉴틈이 없다. 야적장에 날마다 작은 종이산이 만들어졌다 허물어진다. 가냘픈 몸을 하루종일 혹사시켜 얼마를 벌어서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폐지값이 폭락했다니 노부부가 손에 쥐는 돈은 푼돈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작은 소동이 있었다. 좁은 이면도로 중간에서 손수레와 택배차량이 맞닥뜨렸다. 시간이 금쪽같은 택배기사는 손수레가 물러나길 바랐다. 종이박스를 가득 실은 노부부는 유턴할 여력이 없었다. 지친 택배기사가 후진하려고 했다. 때마침 택배차 뒤에 자동차 2대가 잇따라 붙었다. 옴짝달싹. 택배기사에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차 3대가 물러나자 손수레는 앞으로 나아갔다.
재활용품 수거노인은 어떤 존재인가. 앞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자"고 하는 이들도 막상 손수레가 일상에 끼어들면 불편해 한다. 사고나 체증을 유발하는. 가난한 노인의 가장 상징적인 현상을 외면한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재활용품 수거일의 원조격인 넝마주이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산업화가 한창인 1970년대는 폐지나 깡통 따위를 집게로 집어 큰 망태기에 담는 풍경이 흔했다. 넝마주이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지금의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이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몸을 혹사시켜 푼돈을 버는 악순환의 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유모차가 가기 편한 길을 만들고, 무장애길을 지천에 깔고있다. 어린이 친화, 여성 친화 도시는 늘어나고 인증도 족족 잘 받는데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친화도시 인증은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