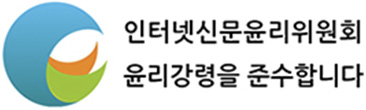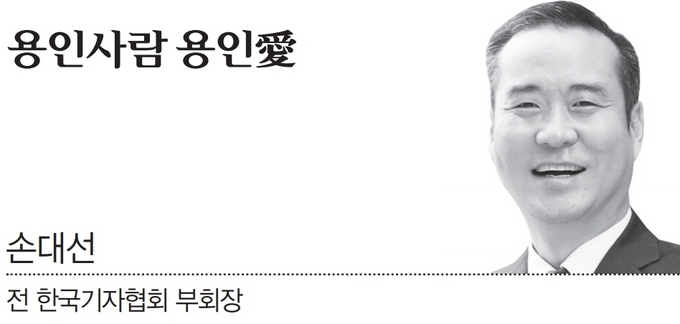
[용인신문] 1999년 겨울이었다. 나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충주행 막차를 탔다. 출발할 때 간간이 날리던 눈발이 용인을 벗어나자 거세졌다.
벼른 습작 여행이었다. 소설주인공은 수몰된 고향을 못 잊어 충주호에 수상가옥을 띄우고 물고기를 잡아 파는 40대 남자. 여성을 유혹해 독으로 중독시킨 뒤 난행을 일삼는 악한이었다.
이른바 악한소설(惡漢小說)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지금와 생각해도 한심하다. 군 제대 후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만학도 처지였지만 창작의 고통보다는 숙취의 고통에 익숙했다. 기발한 상상력과 수려한 문장은 내 것이 아니었다. 여학우들이 대부분인 과에서 술버릇 나쁜 늙다리 학우였다. 결정적으로 특강을 마친 소설가 성석제 선생 뒤풀이 자리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다. 한창 유명세를 치르던 성 선생을 질투하다 흥분해 그의 앞에서 유리컵을 깨물어버렸다. 행패에 앞서 “당신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고 외쳤다는 학우들의 증언. 나는 잘못을 빌기보다는 수모를 떨칠 괴작에 매달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었다.
충주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렸다. 세찬 바람을 동반한 눈발에 눈을 껌뻑이기 힘들었다. 밤 11시 언저리. 최종목적지인 충주호로 향하는 지선버스는 끊겼다. 차고지 인근에서 발견한 2층짜리 충주여인숙. 자정 넘으면 숙박비가 1만 원에서 5000원이 된다는 말을 친절한 여인숙 종업원에게 듣고 밖에서 한참 서성였다. 함석지붕에 눈이 소리 없이 쌓였다. 눈을 털고 여인숙 복도로 들어섰다. 숙박객들은 모두 잠들었는가. 내 발자국 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다.
한 평 반 남짓한 방은 썰렁했다. 전기장판을 이불처럼 몸에 휘감고 구멍가게에서 사 온 소주를 홀짝였다. 무엇을 쓸 것인가. 내가 경험한 확신의 세계가 소설이 돼 세상에 알려지면 여학우들은 물론 성석제 선생도 인정하지 않을까. 곱은 손가락을 펴 신춘문예 당선소감문을 써 내려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친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3시께였다. 귀를 기울이니 옆방이었다. 목젖 아래서 솟아오르는 남녀의 절박한 소리. 남자가 어? 어? 어? 하고 물으면 여자가 아! 아! 아! 하고 화답하는, 분명 교접의 언어였다. 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곧 흥미로웠고, 마침내는 화가 났다. 벽을 쳐 가볍게 항의했다. 잠 좀 자자고. 한참이 지났는데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다. 두 번 더 반복. 참을 수가 없었다. 슬리퍼를 끌고 옆방 문을 두드렸다. 보고 말았다. 벌어진 문틈. 미안한 표정으로 수화를 하는 언어장애인 한 쌍. 손사래를 치고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동안 써내려간 확신의 문장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