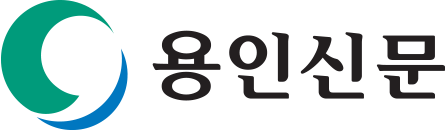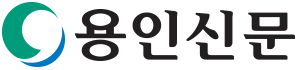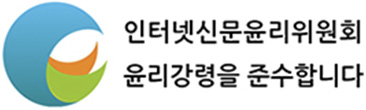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
||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특히 시 측은 이 정책이 지난 2010년 시행됐음에도 뒷짐 행정을 펼치다가 최근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후 일부 공직자들에게 정책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과 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책보다 기관평가에서의 실적이 더 중요했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양육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을 위하 중앙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전면 실시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 근무일을 스스로 지정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과 양육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먼저 유연근무제를 도입, 사회적인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용인시의 경우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측은 지난해 1월 정부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유연근무제를 포함하고, 지난해 4월 기관평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 9월 경기도 합동평가 점검 당시 유연근무제 실적 부분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자체 공문을 시행, 각 부서에 ‘적극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 측은 두 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본청 사무관과 주무팀장을 시범참여자로 지정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유연근무제 이용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61명이, 올해는 지난달 25일 현재 223명이 이용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이용자가 19명인데 비해 공문이 시행된 9월 이후 급증, 사무관 등에 대한 강제이행을 시작한 11월에만 13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집행부 측은 “유연근무제 이용 문을 열어두었지만,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목소리다.
공직자 A(34·여)씨는 “과거에도 유연근무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직 분위기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맞벌이와 양육을 함께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즉,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한 정책임에도 시 집행부가 분위기 조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직자 B(45·남)씨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며 “사회적 화두인 ‘복지’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닌데 시 집행부에서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