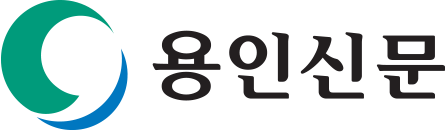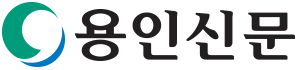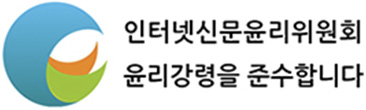1400년·1523년 각 창건된 용인향교·양지향교
1576년·1650년 설립된 충렬서원·심곡서원 등
당대 최고의 인재 양성 공교육 역사적인 현장
인구 1만 7000명 고을에 과거급제자 300명 배출
현재 단국대·경희대·명지대·한국외대로 이어져
1. 왕과 공신이 반한 땅, 용인
❷ 교육 도시 용인 … 과거 합격율 최다(?)
3. 풍수지리와 명당 '용인 땅'
4. 용인 사람들의 숨은 저력
용인신문 | 조선의 지도에서 용인을 찾는다는 건, 단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운’을 따라가는 일이었다.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과거급제자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배출됐다. 성균관으로 향하던 유생의 발걸음, 붓끝으로 벼슬길을 열던 글재주 좋은 인물들이 용인의 마을과 골짜기에서 나고 자랐다.
왕에게 충성을 다한 공신에게 하사된 식읍의 땅, 그게 용인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단지 권력과 명예의 상징으로만 존재하진 않았다. 용인은 경기권 안에서도 유독 사족층. 즉, 양반 지주 가문이 두텁게 자리 잡은 고장이었고, 문과와 무과, 진사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인재를 길러냈다. 곡식만 자라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땅이었다. 용인은, 처음부터 ‘배움의 자격’을 갖춘 도시였던 셈이다.
그 흔적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1400년(정종 2)에 창건된 용인향교와 1523년(중종 18)에 세워진 양지향교는 용인 지역 교육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또 1576년(선조 9)에 설립된 충렬서원과 1650년(효종 1)에 세워진 심곡서원 등은 당대의 학문적 깊이와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심곡서원의 명륜당은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된 명륜학원으로 이어지며 문정중학교의 전신이 되기도 했다.
서원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곳이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인격을 다듬고, 학문이 성품으로 이어지던 자리. 향교는 그 지역 사회가 공교육을 시작하던 첫 현장이었고, 그 안엔 도리와 예절, 그리고 공동체의 품격이 녹아 있었다. 학문은 단지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설계하는 언어였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그런 배움의 기운이 오랜 시간 동안 용인의 바람과 함께 흘렀다.
# 15~20%가 양반 신분… 뿌리 깊은 ‘배움의 땅’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자.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약 500년에 걸쳐 680여 회가 치러졌다. 급제자 수는 문과, 무과, 진사를 포함해 총 10만여 명. 하지만 그 수치는 조선 전체 인구, 평균 700만~1000만 명 수준을 고려하면 극소수만이 오를 수 있는 길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수능 만점자보다 드문 존재였다. 전국의 수 많은 고을들, 특히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의 산간 지역이나 양반 기반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평생 단 한 명도 급제자를 내지 못한 곳도 많았다. 그러나 용인은 달랐다. 이 고을 하나에서만 300명 이상의 과거급제자가 배출됐다. 그것도 문과만이 아니라 무과, 진사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퍼져 있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도시가 어떤 기초체력을 가진 곳인지 말해주는 상징이다.
조선시대 용인은 단지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고을이 아니라, 애초에 그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갖춘 지역이었다. 당시 용인의 전체 인구는 약 1만 7000명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그중 무려 15~20%가 양반 신분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문중 중심의 교육과 독서, 향교와 서원을 통한 학문 전승이 일상처럼 이뤄지던 곳이었다. 과거급제자 300명이라는 기록 역시 이러한 양반 문화의 토양 위에서 가능했던 성과였다.
놀라운 것은, 이 교육의 전통이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대는 바뀌고, 시험은 사라졌지만, 배움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용인은 다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대의 교육도시’로 변모했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위치, 그리고 교육에 진심인 부모들이 몰려드는 땅.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는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학군지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용인시는 과거의 교육적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다수의 대학교와 연구소, 연수원이 밀집해 있어 명실상부한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본교와 캠퍼스가 위치해 있어 젊고 활기찬 학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협력하여 설립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고)는 전국적인 명문고로 자리 잡으며 용인 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학교가 입시 정보 커뮤니티에서 ‘핫한 학교’로 꼽히고 있다. 용인은 더 이상 서울의 그림자가 아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교육 중심지로 우뚝 섰다.
# 사람이 자라는 도시·배움이 일상인 도시
용인은 교육 인프라에서도 특별하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밀도의 도서관 정책,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생활밀착형 인문학 강좌, 그리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교육 프로그램까지. 배움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특권이 아니다. 아이와 부모,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도서관을 찾고, 토론하고, 글을 쓴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배움을 즐기는 사람’을 키워내는 도시. 용인의 자랑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용인 역사의 모든 흐름은 누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 도시 마케팅으로 포장된 이름이 아니다. 수많은 가족이 오롯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용인을 택하고 있고, 그 선택이 쌓여 오늘의 용인을 만들어냈다. 교육 중심의 이주는 이제 인구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고, 이곳에 정착한 부모들은 학군과 생활 여건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배움에 대한 믿음과 도시가 지닌 철학의 결과다.
사람이 자라는 도시,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책과 강의와 토론이 삶의 일부가 되는 도시. 조선의 선비들이 서원 마루에 앉아 글을 읽던 그 마음이 이어진 용인은 오래전부터 ‘교육의 도시’였던 것이다. 수백 년을 두고 다져진 그 뿌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배움의 도시다.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