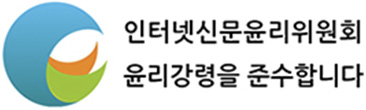용인신문 | “우리 사회 언어의 병은 듣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자들만 있어요. 듣는 자가 없으니 인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담벼락에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읽었던 산문집 ‘허송세월’의 작가 김훈 선생이 한 말이다. 그의 나이 76세. 산문집 초반부터 건강과 일상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작가와의 친분은 없지만, 한때는 유명 소설 제목보다 등산 또는 자전거를 그의 상징처럼 기억했다. 그의 산문 ‘라면을 끓이며’를 읽다가 대파 한뿌리를 고집하는 나만의 레시피와 똑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라면의 미학’을 발견한 듯 박수를 쳤을 정도다. 어쩌면 작가의 글을 닮고 싶어서 그의 취미나 신변잡기를 표방하려는 심리마저 있었는지 모르겠다.
김훈 선생은 요즘 우리 사회에 말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말이 없고, 그나마 제대로 들어주는 이조차 없으니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불통의 시대임을 비판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 또는 정치지도자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나라의 원로나 석학들이 나서서 꾸짖었다. 언론도 정권 눈치가 보이면 종교 지도자나 석학들의 말을 빌려와 에둘러 비판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큰 스님, 원로 목사님, 아니면 문인들이나 철학자들이 한때 우리 사회의 어른 역할을 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대통령도 그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할 정도였다. 그들의 말은 아주 간결했지만, 위엄이 있었다.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큰 어른도, 지혜의 말씀도 실종됐다. 대신 TV 종편 방송에 출연한 수많은 패널이 쏟아낸 증오와 혐오의 말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언론사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그래서 거짓과 진실의 말풍선만 떠돌 뿐, 진실이 소통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정치권도 대화를 위해 마주 앉지만, 정작 자기 할 말만 하고 등을 돌린다. 언론도 흑백논리를 그대로 전달만 할 뿐, 제대로 된 논평을 하지 않는다.
김훈 작가는 “국회를 보면 다 말 병이 걸린 것 같다. 악다구니와 저주와 욕설이 가득하다”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는 극단적 언어와 적대감이 가득한 우리 사회의 표본이 됐다. 그런데도 그는 교양 있는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설마 그렇게 학력 좋고 돈 많은 사람이 교양있는 말을 몰라서 그럴까.
문제는 언론이다. 아예 병든 언어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내버려 둬야 한다. 대신 비판을 해야 한다. 아울러 동영상이 아닌 활자로 된 신문에서 가십 기사 정도로만 내보내면. 본인들도 더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말 한마디만 잘하면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명심보감에는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즉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소통’을 위한 말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재앙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