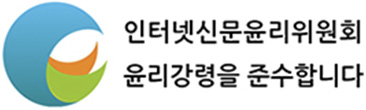[용인신문] ‘풍문으로만 떠돌던/ 수몰 지구 편입설이 끝내/ 신문 귀퉁이를 장식했다 //대를 이어온 고향 마을// 늙은 이장은 술만 취하면/ 대추나무에 매달린 스피커로/ 뽕짝을 흘려보냈다/ 마을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흉흉한 민심을 읽고// 수몰 아니면 화장터와 납골당/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군부대와 사격장이/ 들어온다는 불온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부동산 뚜쟁이들의 잦은 출몰로/ 마을 곳곳에/ 붉은 말뚝이 박히고//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자/ 호수공원을 낀 신도시가 들어섰다/ 수백 년을 이어온 원주민들만/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꽃비가 내리는/ 봄날이면/ 고향 마을 하늘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지낸다는/ 웃픈 이야기’
‘수몰의 역사’라는 나의 졸시다. 여기서 수몰 지구는 1964년 착공해서 1972년에 준공된 처인구 이동읍의 ‘이동저수지’다. 나머지 소재들 역시 용인의 개발 과정과 풍경을 소재로 했다.
용인지명 600년 역사상 가장 큰 토건 사업이었을 ‘어비리(송전) 저수지’. 이때 처음 수몰민들이 생겨났다. 지금은 각종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 레저·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상상이 안 되지만. 최근엔 인근 지역에 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50여 년 전, 그러니까 수몰 전 어비리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그 마을이 물속에 잠겼다. 그나마 저수지 변에 세워진 ‘어비울비각’을 통해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조상의 대를 이어온 마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세웠다. 수몰민들은 ‘원어비동유적영세불망비(元魚肥洞遺跡永世不忘碑)’라는 비문을 세웠다. 기자는 이곳에서 수몰민들의 망향제를 여러 차례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용인시의 현대화는 90년대 초반부터 수지구를 거점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땐 철거민과 이주민들이 발생했고, 각종 개발 광풍에 떠밀리고 떠밀려온 현대판 유목민들이 생겨났다. 원주민 비율이 불과 10% 수준도 안 될 만큼 급격한 인구이동과 팽창을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농복합 용인시가 이젠 농촌까지 개발 광풍에 휩싸인 지 오래다.
사람은 태어났다 죽을 때 대부분 기억의 공간(묘소, 수목장 등)을 만들고 떠난다. 하물며 수십, 수백 년을 살아온 공간을 내 의지와 무관하게 떠나야 한다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사건일 수도 있다. 게다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 마을이라면 그 자체가 원주민(문화재) 보호구역이자 정체성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6일 용인시청 앞엔 노인이 주류인 남사읍 창리 주민들이 국가산업단지 제척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용인신문 기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보아온 진부한 풍경일 수도 있지만, 개발에 떠밀려 떠나야만 할 주름 깊은 노인들의 얼굴을 마주치자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